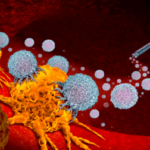천문연 먼 궤도 도는 슈퍼지구 찾았다 자체 관측시스템으로 발견
천문연 먼 궤도 도는 슈퍼지구 찾았다 자체 관측시스템으로 발견
상용망에서 254㎞ 양자 통신 성공 양자 인터넷 시대가 다가온다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을 활용하여 토성보다 먼 궤도로 공전하는 ‘장주기 슈퍼지구’를 발견했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되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KMTNet을 통해 수년간 관측한 외계행성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행성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형성 과정을 거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외계행성은 태양계 바깥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의미한다.
그 중 슈퍼지구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으로, 질량이 지구의 약 1~10배 사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견된 ‘OGLE-2016-BLG-0007Lb’는 지구 질량의 1.3배에 달하며, 지구로부터 약 1만4000광년, 즉 대략 9조4600억㎞ 떨어져 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10배인 15억㎞ 거리에서 태양 질량의 0.6배 정도 되는 모항성을 공전하고 있다.
이 외계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장주기 슈퍼지구 중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지며, 모항성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 공전 주기는 약 40년으로 추정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KMTNet 시스템을 통해 이 외계행성을 발견했다.
KMTNet은 미시중력렌즈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별과 관측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천체가 지나갈 때
천체의 중력에 의해 별의 밝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외계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KMTNet 가동 이후 총 227개의 외계행성을 직접 발견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KMTNet으로 발견한 외계행성 63개를 분석하고 장주기 외계행성 표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슈퍼지구와 가스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별 100개 중 약 35개는 슈퍼지구, 약 12개는 목성형 행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주기 외계행성 중 지구형 행성이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이번 연구는 행성 탄생 과정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천문학자들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면,
중간 크기의 행성보다는 양 극단의 행성이 더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관측을 통해 실제로
슈퍼지구와 목성형 행성이 많이 발견된 반면, 중간 크기 행성은 드물게 나타나 이러한 예측을 지지했다.
주도 연구자인 정연길 천문연 선임연구원은 “이론의 예측대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관측 결과로 입증하고, 우주에 장주기 슈퍼지구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외계행성은 행성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KMTNet을 활용하여 외계행성 표본을 더욱 확충하고,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