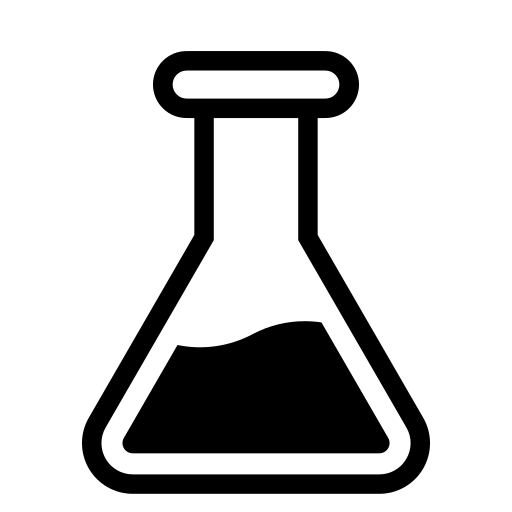자연이 만든 정밀 센서 문어 빨판의 미생물 감지 능력

자연이 만든 정밀 센서 문어 빨판의 미생물 감지 능력
자연이 만든 정밀 센서 문어 빨판의 미생물 감지 능력
동물 대신 미니 장기로 실험한다 삼성바이오 오가노이드 사업 돌입
문어가 바다 속 환경에서 먹잇감을 찾고 알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 표면에 붙은 미생물이 분비하는 물질을 분석하며 행동을 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촉감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센서를 활용해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다.
미국 하버드대 니콜라스 벨로노 교수 연구진은 문어가 사물의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화학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먹잇감의 신선도와 알의 상태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7일 국제 학술지 셀(Cell)에 공개되었다.
문어는 몸 각 부위마다 200개 이상의 빨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먹잇감을 평가한다.
이 빨판에는 감각 수용체를 가진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다. 벨로노 교수는 "문어는 감각 수용체를 통해 환경 표면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레베카 세펠라 박사후연구원이 캘리포니아 두점박이 문어(Octopus bimaculoides) 어미가 알을 선별하고 일부를 버리는 모습을 우연히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이후 현미경 분석을 통해 버려진 알에서 특정 미생물이 발견됨을 확인한 뒤, 문어가 직접 사물이 아닌 표면의 미생물 군집을 감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 결과, 연구진은 일부 특정 미생물만이 문어의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미생물은 대개 상하거나 죽은 먹잇감과 문제가 있는 알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예컨대, H3C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미생물은 죽은 게의 껍데기에서 발견되며, 이는 문어에게 "먹이가 신선하지 않다"는 신호를 전달했다.
반면 건강한 알에 붙은 미생물은 양호한 상태임을 알렸고, 문어는 계속해서 알을 돌보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신호가 문어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실험에서 입증했다.
플라스틱 게 모형에 H3C 물질을 도포해 보여주었을 때, 문어는 이를 멀리하거나 회피했다.
반대로 H3C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먹잇감을 삼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벨로노 교수 연구진은 또 이전 연구를 통해 문어가 촉감과 맛을 동시에 감지한다는 사실과 빨판이 물에 녹지 않는 기름 분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감각 체계가 문어가 바다 밑 표면에서 먹이와 알을 구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세펠라 박사는 미생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화학 신호로 반영하고 이를 문어에게 전달함으로써 화학 통역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간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에게도 장내 미생물이 식욕, 면역,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그 신경과 행동 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웠던 반면, 문어는 단순한 생체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다른 동물들 또한 미생물을 감지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단세포 생물인 편모조류 역시 특정 미생물을 감지해 군집을 형성하며 마치 다세포 생명체처럼 작동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