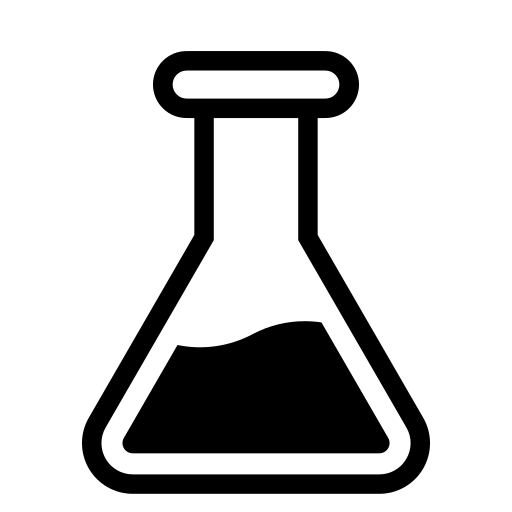수천 년 전에도 빈대는 있었다 인류 최초 도시의 숨겨진 주민 이야기

수천 년 전에도 빈대는 있었다 인류 최초 도시의 숨겨진 주민 이야기
수천 년 전에도 빈대는 있었다 인류 최초 도시의 숨겨진 주민 이야기
실험실 안전 정확도 UP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료적 활용 돌파구
나는 빈대를 누구보다도 싫어했다. 하지만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빈대 몇 마리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내게 만약 고민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빈대에 물려 긁다 하얗게 흉터를 만들곤 했는데, 괴로우면서도 묘한 쾌감이 따랐다. 그렇게 다시 단잠에 빠지곤 했다.
이는 한국 작가 이상(李箱, 1910~1937년)이 일본 강점기 시절인 1936년에 잡지 ‘조광’에 발표한 단편소설 날개에서 묘사한 내용이다.
작품 속 주인공은 아내의 경제적 지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빈대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경제 발전과 위생 개선으로 인해 빈대를 실제로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전만큼 통용되지 않는 속담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역시 많은 학생들에게 그 의미가 낯설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빈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 빈대는 다시 세력을 확장하며 부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인간들이 쏟아냈던 강력한 살충제 공세에는 밀렸지만
세계화와 국제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를 타고 저개발국의 빈민촌부터 선진국의 고급 호텔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
국내 사례로는 최근 한 가족 여행객이 지방의 한 호텔에서 이불과 벽, 그리고 천장에서 빈대를 발견해 논란이 된 일이 있다.
이제는 빈대의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와 역사를 함께해 온 첫 기생충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교의 워런 부스 교수에 따르면, 빈대는 먼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를 따라 함께 진화해 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빈대는 약 6만 년 전 동굴 속 박쥐에 기생하다 우연히 네안데르탈인에게 옮겨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국제 학술지 바이올로지 레터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박쥐의 빈대는 현재 개체 수가 크게 줄었지만, 인간에게 정착한 빈대는 도시화와 함께 급격히 번성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체코에서 수집한 19마리의 빈대를 연구했는데, 이 중 9마리는 인간에 기생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박쥐에서 수집된 것이었다.
DNA 돌연변이를 분석해 그들의 진화 역사를 추적한 결과, 두 그룹의 공통 조상이 약 4만5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한 차례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운명은 달라졌다. 박쥐에 기생하던 빈대는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든 반면, 인간과 함께 살게 된 빈대는 약 8000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농경 문명이 발달하며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약 9000년 전 지금의 튀르키예에 위치했던 차탈회유크(Çatalhöyük)는 몇 천 명이 거주했으나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우루크(Uruk)는 인구가 무려 6만 명에 달했다.
이번 연구는 빈대가 인류의 역사 속 가장 초창기부터 함께해 온 적응력이 뛰어난 기생충임을 증명한다.
중세 시대 쥐를 통해 퍼진 벼룩은 페스트균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빈대는 피부를 찌르고 소량의 피를 빨며 불쾌감을 줄 뿐, 상대적으로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생존을 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