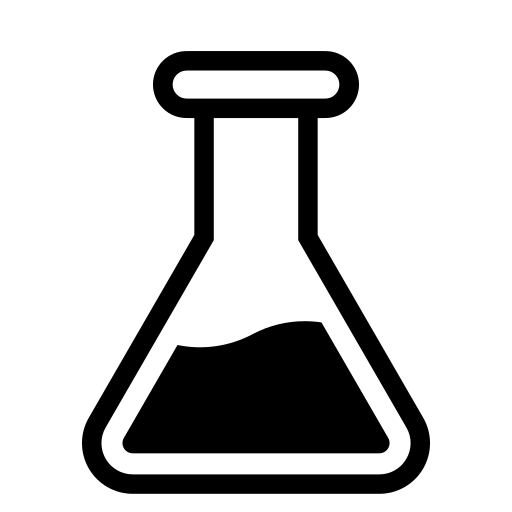민항기 정비공장 공석 50돌파 해외위탁 과다로 산업 기반 흔들

민항기 정비공장 공석 50돌파 해외위탁 과다로 산업 기반 흔들
민항기 정비공장 공석 50돌파 해외위탁 과다로 산업 기반 흔들
수천 년 전에도 빈대는 있었다 인류 최초 도시의 숨겨진 주민 이야기
B-747 항공기가 동시에 최대 네 대까지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정비 시설이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공장이 비어 있는 날이 많다.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11일 경남 사천시 용당리에 위치한 MRO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공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으며, KAI의 자회사이자 국내 유일 국토교통부 인증 MRO 기업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함께 MRO 산업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전투기나 헬기와 같은 항공기는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항공 MRO 시장 규모는 기기 수출액의 1.5~2배 수준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전투기 FA-50을 48대 판매하면 약 4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FA-50 관련 MRO 시장 규모는 이를 뛰어넘는 약 6조 원에 달한다.
KAEMS 군수동과 헬기동은 정비 중인 여러 항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헬기동에서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용하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정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KAEMS 상무인 배도한 씨는 “보통 헬기 정비에는 일주일이 걸리지만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에는 2~3일 만에 작업을 마쳤다”며 “긴급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밤낮없이 정비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KAEMS는 단순히 정비와 보수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개량 작업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군수동에서는 팰콘 2000LXS를 정찰기로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닷소사에서 제작한 쌍발 제트 여객기를 정찰기로 변환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군수동과 헬기동의 활발한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민항기동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규모는 가장 크지만 정비 중인 민항기는 고작 한 대뿐이었으며, 그나마도 국내 항공사가 아닌 필리핀 항공사의 항공기였다.
민항기동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국내 항공사들의 로고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국내 항공사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이는 KAEMS에 일부 지분을 가진 국내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배 상무는 이 상황을 아쉬워하며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의 항공기 MRO를 확보하려 노력하지만, 동남아시아나 몽골 대비 높은 인건비 탓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비용 항공기의 정비비는 약 6억~7억 원에 달하지만, 인건비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비용이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KAEMS 대신 해외 MRO 업체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배 상무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정비에 연간 약 3조 원을 지출하지만, 이 중 약 3분의 2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3억~4억 원 수준으로 정비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정비를 맡기는 저비용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