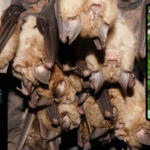제약바이오 얕보다 큰코 대기업 바이오 M&A 흑역사
제약바이오 얕보다 큰코 대기업 바이오 M&A 흑역사
OCI와 손을 잡은 한미약품(325,500원 7,500 2.36%)과 오리온(89,700원 2,300 -2.5%)이 인수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 개발을 하는 국내 제약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또 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제약사에게 조 단위의 대규모 기술이전(라이선스아웃)을 해 본 경험이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얀센바이오테크에 2조원대 기술이전에 성공했고,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부터 사노피와 제넨텍, 로슈에 수조 원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OCI와 한미, 오리온과 레고켐의 결합을 두고 현금은 있지만, 업계는 신성장 동력을 찾는 대기업과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신약개발 기업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는 보통 사업 초창기에 신약 후보물질을 큰 회사에 기술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유한양행(59,600원 ▼ 100 -0.17%)이 얀센에 기술을 이전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가장 성공한 경우다.
이때는 벤처캐피털(VC) 투자로 받은 자금으로 연구개발(R&D)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하우가 쌓이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기술이전을 넘어 글로벌 시장 신약 출시에 도전하게 된다.
여기서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희비가 교차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개발하려면 미국을 포함해 다국가 임상을 해야 한다.
약 1조원 가량의 임상 비용은 차치하고, 환자 투약 후에 2~3년 이상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단계가 되면 1~2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사모펀드(PEF)는 선뜻 투자가 어렵다.
제약업계에서 신약개발을 ‘머니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해외 바이오벤처들은 상장(IPO)이나 펀드 투자를 받기보다는 대기업 제약사에 M&A되는 방식을 활발히 택한다.
같은 제약사라면 신약 개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는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산업이다.
특허가 보장되고, 원가 대비 이익률이 높다. 삼성과 SK가 코로나19 시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로
성과를 낸 것이 본보기가 됐고, 롯데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뛰어들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정작 제약업계에서는 제조업의 제약바이오 산업 진출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793,000원 23,000 2.99%)와 롯데바이오로직스 처럼 의약품위탁생산(CMO)을 하는 것과 신약개발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62,800원 200 -0.32%)도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방역 상황 등으로 손해가 막심하다.
국내 대기업들은 제약업에 진출했다가 철회하고, 재도전하는 흑역사를 하나씩 갖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세운 롯데가 대표적이다.
롯데는 지난 2002년 아이와이피엔에프를 인수하며 롯데제약을 출범했지만 2011년 건강기능식품만 남기고 사업을 접었다.
그 당시 롯데가 의약품 산업의 높은 규제 허들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롯데는 지난 2022년 미국 뉴욕 동부에 위치한 BMS 공장을 1억6000만 달러에 인수하며 제약산업에 재진출했다.
CJ는 1984년 유풍제약, 2006년 한일약품을 각각 인수하며 의약품 시장에 진출했지만, 지난 2014년 CJ헬스케어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한 후 2018년 한국콜마에 CJ헬스케어 매각했다.
CJ는 2021년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천랩을 인수해 CJ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하며 신약 개발에 다시 뛰어들었다.
한화그룹은 의약품 사업 진출을 선언한 후 2004년 에이치팜, 2006년 한국메디텍제약을 인수하고 신약 개발에 도전했지만 좌절했다.
결과적으로 한화는 신약개발 도전 10여년 만인 2014년 드림파마의 지분을 미국 알보젠에 매각하면서 철수했다.
한화는 바이오를 눈여겨보고 있지만, 신약개발보다는 바이오와 정보기술 AI가 융합된 헬스케어를 눈여겨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