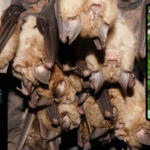소수정예와 국제화 갈림길에 선 포스텍
소수정예와 국제화 갈림길에 선 포스텍
빅데이터가 말했다 야생동물의 가장 큰 천적 인간 이라고
포스텍 역대 총장들이 재임 시절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대학이 있다.
바로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캘리포니아공대(칼텍)이다. 포스텍과 칼텍은 실제 닮은 부분이 많다.
칼텍은 메사추세츠공대(MIT)와 쌍벽을 이루는 연구중심 대학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칼텍이 훨씬 작다.
작지만 강한, 소수정예가 칼텍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포스텍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비해 규모가 작은 대신 소수정예를 모토로 삼고 있다.
포스텍의 역대 총장들이 늘 “한국의 칼텍이 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그런데 포스텍과 칼텍이 마냥 닮은 꼴인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제화 지표에서 나온다.
포스텍의 교수진의 수준은 사실 칼텍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초소형 광학 기술의 권위자인 노준석 교수와 기하학적 해석학 분야의 권위자인 최범준 교수 같은 젊은 연구자들이
포스텍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비율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다.
포스텍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주요 대학들과 비교해 가장 부진한 지표는 외국인 학생 비율(International Students Ratio)이다.
포스텍은 이 부문에서 2.6점을 받았다. 서울대(14.5) KAIST(11.6) 등 경쟁대학에 비해 열세였고, 포스텍이 목표로 삼는 칼텍(81)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적은 건 대학알리미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을 기준으로 보면 포스텍의 학생정원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은 5.32%에 머문다. KAIST(10.93%)나 서울대(9.58%)의 절반 수준이다.
후발주자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10.41%, 울산과학기술원(UNIST) 7.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7.7%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46%인 칼텍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포스텍은 외국인 학생 수가 적은 건 소수 정예를 추구하는 학교의 방향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텍은 “대학원생은 학생인 동시에 중요한 연구 인력으로, 포스텍은 우수 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 사정을 엄격하게 해왔다”며
“단순히 외국인 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얼마나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를 받느냐는 과학기술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한다.
과학기술 강국인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 곳곳에서 학생을 받는 이유다.
게다가 한국이 저출산 사회로 바뀌면서 이공계 연구 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낮다는 건 미래 경쟁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포스텍을 옹호하는 포스텍 동문들도 국제화 지표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때 칼텍을 꿈꾸며 질주하던 포스텍이 이 문제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포스텍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학교 안팎의 관계자들은 학교본부의 학생 유치 전략 부재와 외국인에 배타적인 학교 분위기를 원인으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