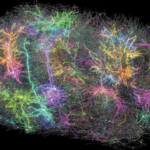기상예보 예산 미국의 100분의 1 극한 기상에도 투자는 뒷걸음질
기상예보 예산 미국의 100분의 1 극한 기상에도 투자는 뒷걸음질
서울 시민들은 지난 7월 21일 이후 한 달째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다.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장마철이던 지난달 시간당 100㎜에 달하는 폭우가 심심치 않게 찾아왔다.
폭염과 폭우라는 극한 기상이 일상화되면서 기상 관측과 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기상 선진국과 비교하면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한 기상에 대응하려면 예보 능력부터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의 ‘기상선진국 투자현황 분석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상청의
예산은 4697억원이고, 미국 기상청(NWS) 예산은 13억 2000만달러(약 1조 7204억원)이다.
이 보고서는 기상과학원이 작년 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했다.
한국과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가 2.4배인데, 두 나라의 기상청 예산만 보면 경제 규모 차이와 얼핏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두 나라의 기상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의 기상청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산하 기관 중 하나다.
한국 기상청이 하는 업무는 미국 기상청이 아니라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의 4개 기관이 하는 업무와 겹친다.
NOAA 산하에는 모두 5개 기관이 있는데, 이 중 기상청과 업무가 다른 수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의 예산을 합하면 51억달러(약 6조 6312억원)로 우리 기상청과 1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진은 “우리 기상청이 수행하는 지진·화산 관련 업무는 NOAA와 상관없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전담하고 있다”며 “미국 국립과학연구재단의 기상 R&D까지 우리 기상청 업무를 하는 곳의
예산을 모두 찾아서 비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상 예산 차이는 17.3배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가 기상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연구진은 기상 피해가 많은 10개 주 정부만 따져도 미국의 전체 기상 관련 예산은 88억 1000만달러(약 11조 4504억원)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상청 예산보다 24.4배 많은 규모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차이가 더 큰 경우도 있다. 우리 기상청의 기상예보 예산은 117억 5800만원인데
미국은 9억 2250만달러(약 1조 1992억원)에 달한다. 기상예보 예산 차이가 101배에 달한다.
기상관측 예산은 한국이 1226억 5500만원인데 비해 미국은 42억 2500만달러(약 5조 5315억원)로 차이가 41.7배 났고
기후변화과학 예산도 한국이 150억 1600만원인데 비해 미국은 3억 5230만달러(약 4580억원)로 29.5배 차이가 났다.
기상연구 예산도 한국이 661억 3300만원, 미국은 2억 9680만달러(약 3858억원)로 4.8배 차이가 났다.
국민 1인당 기상 예산은 한국이 9078원, 미국은 3만 4126원으로 차이가 컸다.
1인당 GDP 차이가 2.4배인데 비해 1인당 기상 예산 차이는 그보다 큰 4배에 가깝다.
연세대 연구진은 “미국은 지난 10년간 기상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세계 최고의 기상 선진국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보다 3.7배 이상 기상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상청이 기후위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상레이더 관측과 해양기상 관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